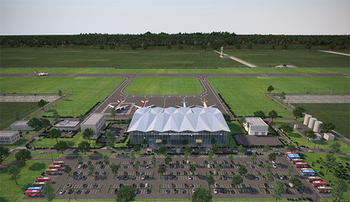‘연모’ 로운이 드디어 박은빈이 첫사랑이란 사실을 알았다. 드디어 완성된 운명 로맨스에 시청률은 전회보다 상승, 9.4%를 기록했다. 월화드라마 1위로, 적수 없는 정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기준)
지난 7일 방영된 KBS 2TV 월화드라마 ‘연모’(연출 송현욱, 이현석, 극본 한희정, 제작 아크미디어, 몬스터유니온) 18회에서 혼인을 하겠다며 이별을 고한 정지운(로운)은 이휘(박은빈)의 눈물을 애써 외면했다. “그리 쉽게 흔들릴 마음이었냐”며 분노의 주먹을 날린 벗 이현(남윤수)에겐 “전하를 지킬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것”이라 다짐했고, 아버지 정석조(배수빈)에겐 “반드시 전하의 비밀을 지켜달라”는 약조를 받아냈다.
그리고는 혜종(이필모)의 목숨을 앗아간 소낭초 독의 출처를 찾는 데 박차를 가했고, 마침내 삼개방 질금(장세현)이 한기재(윤제문)가 관리하는 약방 주인과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런데 그 장소에 검은 든 자객들이 갑자기 나타나, 질금의 목숨을 위협, 소낭초를 찾는 배후에 대해 추궁했다. 아버지 정석조(배수빈)로부터 한기재가 판 함정이란 사실을 들은 지운이 뒤늦게 합류해 맞섰지만, 수적 열세엔 도리가 없었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버티던 지운을 구해낸 건 정석조였다. 한기재의 명을 어기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지운과 질금을 보냈다.
그 사이 추문에 의심이 깊어진 한기재는 중전 노하경(정채연)의 궁녀 유공(한성연)을 불러 다그쳤다. 그 무서운 기세에 눌린 유공은 결국 “합방일에 요가 두 개가 들어왔다”는 중궁전의 비밀을 고하고 말았다. 한기재는 이어 “전하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넌지시 하경을 떠봤고, “전하께서 나를 많이 아끼신다.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 것”이라 답하면서도 떨리는 그녀의 손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놓치지 않았다.
원산군(김택)은 그 의심에 불을 질렀다. 쌍생의 태를 한기재에게 보낸 그는 휘가 자객의 습격을 받아 옷고름이 풀렸던 사건을 알리며, 10년 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던 세자를 상기시켰다. 한기재의 권력욕이 핏줄보다 강하다고 판단한 원산군은 “내가 대감의 패가 돼드리겠다. 나와 손 잡자”고 호기로운 제안에 대노한 나머지 소리치는 그에게 “곧 나를 다시 찾게 될 것”이라 자신했다.
선택의 기로에 선 한기재는 휘와 독대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쌍생이었던 계집아이가 이 나라 왕이 돼있다”는 참으로 재미난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 모두 거짓말은 아니라고 운을 뗐다. 이어 조카를 죽이고 옥좌에 오른 선왕이 불길하다 여기는 쌍생 소문이 퍼질까 누구보다 두려워했기에, 자신이 휘의 누이부터 쌍생의 사실을 아는 이들 모두 다 죽이라 명했다는 과거를 덤덤히 이어갔다. 앞으로도 이 사실을 아는 자, 그리고 왕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 죽일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도 함께였다. 각오했던 일이었지만, 이 모든 고백 아닌 고백을 듣는 휘의 불끈 쥔 주먹은 어느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외조부의 검은 속내에 불안을 감지한 휘는 먼저 김상궁(백현주)과 홍내관(고규필)을 궐 밖으로 피신시켰다. 한기재가 이들을 약점 삼는다면,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내가 어떻게 버텨왔는데,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심시키는 휘를 보며 눈물로 궁을 떠난 김상궁은 지운의 삼개방에 들렸다. 그리고 “전하가 어릴 적 궁녀로 있었다. 그때 이름이 ‘담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리며, “부디 전하를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휘가 그토록 특별했던 첫사랑 ‘담이’란 사실을 알고 가슴이 무너져내린 지운은 곧장 폐전각으로 달려갔다. 휘는 최후를 준비하듯 지운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전하이십니까, 담이가”라며 흐느끼는 지운이 바라본 휘의 손엔 자신이 선물했던 ‘연선’이란 이름이 들려 있었다. 휘와 지운은 그렇게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눈빛으로 서로의 첫사랑을 바라봤다.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둔 ‘연모’는 매주 월, 화, 밤 9시30분 KBS 2TV에서 방송된다.
사진제공 = ‘연모’ 18회 방송 캡처 <저작권자 ⓒ 고정형16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티비다시보기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연예/스포츠 많이 본 기사
|